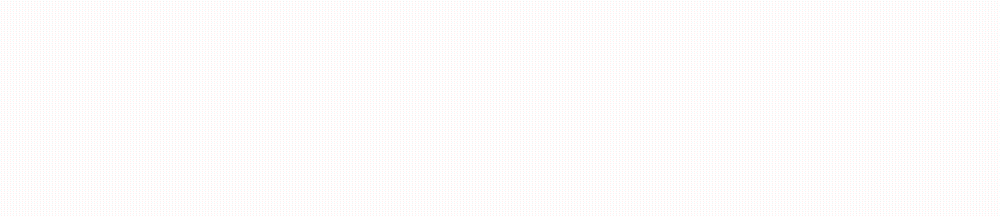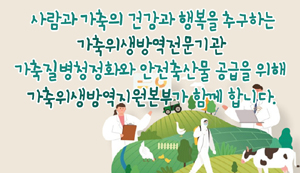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복판에 지름 20미터, 깊이 20미터가 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 구간으로 1공구 터널 상부였다. 시민의 일상이 이어지던 지상 아래에서 진행되던 공사가, 갑작스럽게 도로 전체를 삼켜버린 것이다.
사고는 아직 원인 규명 단계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하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5월 말까지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원인 분석에는 해당 구간의 시공 방식, 지질 조건, 굴착 과정, 감리 체계, 주변 시설물의 상태까지 포함된다. 시공사는 물론, 감리사, 발주처인 서울시 등도 조사 대상이다. 책임의 방향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고 전후의 정황들을 짚어보면 문제의 ‘구조’가 서서히 드러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1공구 구간은 서울시의 공식 평가 자료에서도 ‘복잡한 지질’로 분류돼 있었다. 최소 4곳의 지질 이상대가 분포해 있고, 지하수 흐름도 불안정한 곳이다. 이런 연약지반에서 선택된 굴착 공법은 NATM, 이른바 나틈 공법이었다.
암반에 콘크리트를 분사한 뒤 천공과 기계식 굴착을 통해 터널을 확장하는 이 방식은, 단단한 지반에서는 유효하지만 연약지반에서는 붕괴 위험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적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한 보강 작업이 병행됐는지가 핵심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인근 주유소에선 1월부터 바닥 균열 현상이 나타났고, 수차례 민원이 접수됐다. 3월 14일, 시공사와 서울시는 연도변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인 24일 아침에도 주유소 측은 빗물받이 침하를 신고했다. 지하 토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다. 터널 내부에서는 물이 새는 이상 조짐이 관측됐고,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급히 철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일련의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공사는 왜 계속 됐을까. 이상 징후가 있었고, 경고도 있었지만, 그 무엇도 ‘위험’이라는 신호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는 “지반 보강을 마쳤고, 지하수 계측기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하수는 계측기 하나로 전부 확인되지 않으며, 지질이 복잡할수록 국지적인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계측기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국 중요한 건, 계측기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보였고’,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조치했는가’이다.
이 사고는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유사한 전례도 있다. 2020년 구리 교문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지하철 연장 공사 중 터널 상부가 붕괴했고, 국토부는 “취약 지반에 대한 부실한 보강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었다. 이번 명일동 사고와 마찬가지로 나틈 공법이 적용됐고, 지하수와 연약지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땅이 꺼진 메커니즘은 비슷했고, 경고 신호 역시 있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시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외부 변수나 복합 요인이 작용했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 하나는 있다. 시민의 일상 아래에서 굴착은 진행됐고, 그 위험은 충분히 감지 가능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원인 하나를 특정하는 일이 아니다. 반복된 경고가 왜 무시됐는지, 민원은 왜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는지, 복잡한 지질 구조에서 왜 같은 공법이 반복 적용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징후를 보고도 ‘공사를 멈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고 왜 행사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 도로에 생긴 구멍 하나는 단순한 지반 붕괴가 아니다. 그 아래에는 구조적 회피, 책임의 사각지대, 경제성 중심의 공법 선택, 감독 부실이라는 이름의 공백이 있다. 땅이 꺼진 게 아니다. 감시가 무너졌고, 신뢰가 침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