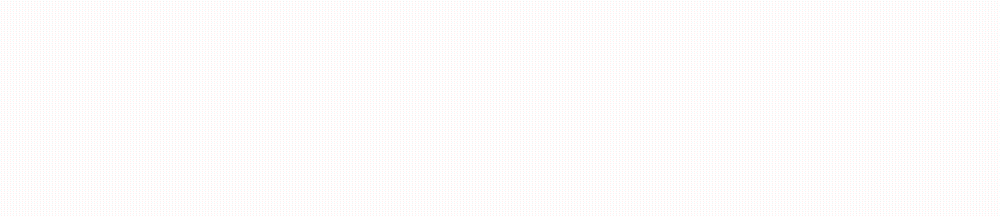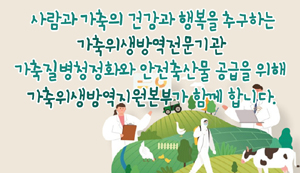‘엄마의 근로기준법’은 어떤 의미일까. 엄마는 정(情)이고, 나눔이고, 천륜의 언어다. 근로기준법은 법(法)이고, 쟁취이고, 자본의 언어다. 시인 강정례는 상반된 이미지의 두 단어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생명의 근원 어머니를 노래했다.
그녀는 생물학적 엄마를 우주의 불멸 존재로 승화시킨다. 탯줄에서 시작돼 숨길로 삶을 꾸미고, 별을 통해 세상 밖과 소통하는 엄마는 46억년 지구의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녀도 시나브로 엄마가 되어간다. 그녀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자연에 녹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시집 이름은 ‘우리집엔 귀신이 산다(푸른산)’이다. 귀신(鬼神)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정령이다. 귀(鬼)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신(神)은 복을 주는 존재다. 그러나 시인이 인식하는 귀신은 정겨운 도깨비와 같은 이미지다. 도깨비는 엄마와의 추억을 말하는 사모곡의 상징으로 영원한 아기자기한 삶을 뜻한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밤하늘을 보던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의 엄마 또 엄마가 바라본 별 하늘을 생각했다. 시인에게 엄마는 생물학적 존재에서 별과 함께 우주로 확산 되어간다. 누대에서 누대로 이어오는 시간을 지배하는 엄마다. 불멸의 존재로 엄마를 완성시키려는 시인의 의지는 시의 곳곳에서 강하게 보여진다. 가령. ‘창백해지는 우주의 푸른 점’은 엄마를 부활시키려는 안간힘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시인은 홋날 하늘에서 엄마를 만날 때 할 말을 ‘작가의 글’에 적었다.
비가 와서 그녀의 어깨가 젖어도
안 암의 통증에 눈동자가 젖어도
난 알아채지 못했어요
국화꽃이 시들어 마른 바람에 뒹굴고
땅속 깊이 녹아내릴 때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의 소풍을 끝내고 다시 그녀를 만나면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랑한단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첫 시집 ‘반죽 소리’에 이어 두 번째 시집 ‘우리 집엔 귀신이 산다’를 쓴 강정례는 경기예술대상, 정지용 문학상, 제3회 『우리글』〈짧은詩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